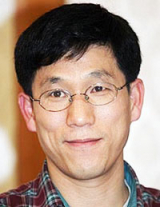
동양대학교 진중권 교수가 이번에는 '메갈리안'에 대한 평론을 시작했다.
진중권 교수는 김자연 성우의 '메갈리안 티셔츠 사건'으로 인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27일 매일신문에 "나도 메갈리안이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진 교수는 이번 사태에 관해 "여성들이 왜 저렇게 화났나 먼저 살펴야한다"며 "남성혐오 메갈에 발끈한 남성들의 비열한 공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진 교수는 "메갈의 '미러링'은 그저 일베만을 상대로한 것이 아니다"라며 "일베는 큰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이 일베와 다르다고 굳게 믿는 남자들이 일상에서 밥 먹듯 저지르는 성차별적 언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자연 성우의 넥슨 하차에 대해 "초라한 남근들이 다발로 묶여 큰 승리를 거둔 모양이다"라며 "이 빛나는 승리를 논쟁과 토론으로 얻어냈다면 참 귀했을 것이나, 남의 밥줄 끊어놓겠다는 비열한 협박으로 얻어낸 양아치 같은 승리라 축하해 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언급했다.
또 진 교수는 "나 같은 '한남충', '개저씨' 눈으로 봐도 너무들한다. 이제야 메갈리안의 행태가 이해가 될 정도"라며 "자기와 견해가 다른 웹툰 작가들의 살생부까지 만들어 돌렸다 들었는데, 살생부에 아직 자리가 있으면 내 이름도 넣어주길 바란다"며 칼럼을 마무리 지었다.
매일신문을 통해 이런 진중권 교수의 칼럼이 기고되자 누리꾼들 사이에도 주장이 엇갈리기 시작하며 대립각이 세워졌다.
아이디 ants****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그래 세상엔 메갈도 있고 메갈 옹호자도 있지. 메갈에 대한 비난에 대응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정의당 탈당, 웹툰 탈퇴는 그와 전혀 다른 문제야. 지금 이 글은 그 사람들을 비난하잖아. 그러니 이 사람도 한심한 거지. 이따위 정의는 지킬 필요가 없는거야"라며 그의 말에 반박했다.
또 닉네임 '적'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2016년 현재 대한민국 남성들이 받고 있는 성차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쟁한번 없던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불만만 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학 교수씩이나 하셨다는 분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시는 건가요?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차별을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진중권씨 같은 사람이야 말로 페미니즘을 이야기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형편없네요"라고 분노했다.
반면 아이디 sigg****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구구절절 동감한다. 참고로 나는 이번 승리(?)의 감격에 도취된 온라인상 남성들의 반응을 보았을 때, 박근혜가 신승을 거둔 지난 대선 다음날 아침 지하철에서 본 노인들의 달뜬 표정이 연상되었다. 저열하기가 난형난제다"라고 진 교수의 의견에 한 표를 던졌다.
또 닉네임 '신사*'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진짜 이 정도는 되어야 진보지. 정말 진중권씨 일관성 있다. 이 상황 이 분위기에서 소신발언....대단하다 진짜. 게다가 메갈애들한테 그렇게 조리돌림 당했음에도....진짜 진정성 있다. 와...진심 멘탈 존경합니다"라며 진 교수의 발언에 동감했다.
이번 사태는 성우 김자연이 자신의 트위터에 '메갈리안 티셔츠'라는 사진을 인증하면서 시작됐다. '메갈리안 티셔츠'는 페이스북 페이지 '메갈리안4' 삭제 관련 페이스북 측과의 소송비용, 명예훼손 등으로 피소당한 메갈리안 회원들의 법적 분쟁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된 티셔츠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 김자연 성우의 '메갈리안 티셔츠'를 본 게임 이용자들이 "메갈 성우가 녹음한 게임을 하고싶지 않다"며 항의를 하기 시작했고, 이에 넥슨 측은 김자연 성우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같은 넥슨의 조치에 일부 웹툰 작가와 누리꾼은 '김자연 성우의 해고를 반대한다'며 입장표명, 시위 활동 등으로 거세게 반발하며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설명 : 7월 28일자 매일신문 26면에 실린 진중권 교수의 칼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