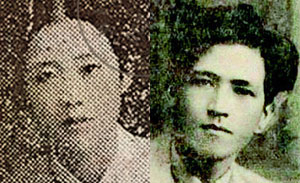
1940년대 식민지 말기의 조선은 황량하고 암울했다. 해방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였지만 누구도 꿈에서조차 해방을 예상치 못하고 있었다. 당시 모든 조선인은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고 "우리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이다"로 시작되는 '황국신민의 서사'를 반복해서 외우며 천황의 충실한 백성임을 마음 깊이 새겨야 했다. 학교에서 조선어 수업은 금지되었으며, 조선총독부 기관지를 제외한 모든 언론이 폐간되었다. 러시아 연해주나 중국 만주에서 풍문처럼 간간이 독립군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지만 그 역시 먼 이야기였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렇게 생활인으로서 삶만 유지하고 있었다. 열정도, 열망도, 희망도 허용되지 않는 시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조선 무산자 계급의 해방을 위해 헌신했던 열렬한 사회주의 투사들 역시 193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이미 이념적 전향을 선포하고, 뒤로 물러서 있었다. 지하련의 '체향초'(滯鄕抄'1941)는 이처럼 식민지 말기 암울한 현실에서 이념을 포기하고 삶을 선택한 자들의 이야기이다. 체향초는 고향에 머물며 겪은 일을 간단하게 묘사한 글이라는 의미이다. 제목처럼 소설은 '삼희'라는 인물이 신병 치료차 고향을 방문하여 겪은 일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고향에서 겪은 일이란 한때 열렬한 사회주의자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이념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오빠와 해후한 일이다.
탈 없이 생활에 안착해 가는 듯한 오빠의 진짜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동생 삼희의 시선에 포착된 오빠의 몇몇 사소한 행동을 통해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오빠는 한여름 뙤약볕 아래에서 더위를 피할 장소도 찾지 않고 잠시도 쉬지 않고 농사일을 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과녁 맞히기를 수도 없이 멍하니 되풀이하기도 한다. 오빠의 이런 불안정한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보는 삼희처럼, 전향 사상가들을 바라보는 소설가 지하련의 시선 역시 차갑다. 소설의 한 등장인물은 '비굴한 사람보다도 사람을 비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더 비굴하다'며 소설을 통해 이들 전향 사상가들의 선택을 애써 비호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상의 전향을 비굴한 행동으로 규정하는 지하련의 판단이 스며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 판단은 작가 지하련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다.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의 서기장이자, 시인이던 임화를 남편으로 둔 지하련이었다. 그의 세 명의 오빠는 조선공산주의자협의회 개최 등 조직 활동으로 수년간 복역할 정도로 열렬한 사회주의자들이었다. 지하련 자신 역시 공산주의자협의회 조직 활동에 가담하여 구금을 당한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1941년의 조선 그 어디에도 이들의 열정적 헌신은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남편 임화는 식민지의 삼엄한 현실에 굴복해서 1930년대 중반에 이미 두 손을 들었고, 세 오빠 역시 마찬가지였다.
시대의 폭력적 힘에 맞서 마지막까지 신념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지하련이 보기에 모든 사람이 '비굴'하게 삶을 연명하고 있었다. 물론 그 자신도 거기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체향초'에서 지하련은 이처럼 식민지 지식인 모두를 향해 비난의 칼날을 겨누고 있었다. 하지만 '거인(巨人)도 죽고 천사도 가고 없는 소란한 시장'과 같은 비루하고도 광폭한 식민지 현실에서 과연 그 누가 순수한 열정을 견지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아무도 그 순수한 열정을 지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과연 '무용한 열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