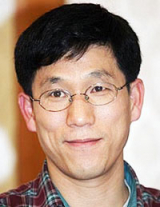
작품 콘셉트 제공 후 대작, 예술계 관행
조영남은 대작 사실 안 밝혀 비난 대상
검찰 수사라는 형법 칼날 들이대면 야만
미학'윤리적 문제 비평'담론으로 다뤄야
화가 조영남 씨가 제 작품을 다른 이에게 '대작'을 시킨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이 '사기죄'로 엮어 수사에 들어갔다. 정의로운 대중은 인터넷에 분노를 쏟아놓기 시작했다. 내가 보기에 이는 현대예술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과잉행동이다. 적어도 미니멀리즘과 개념미술, 그리고 팝아트 이후 예술가가 작품에 '콘셉트'만 제공하고 실행을 다른 이에게 맡기는 것은 예술계의 관행이 되었기 때문이다.
효시는 바우하우스의 모호이-나지일 것이다. 그는 이미 1930년대에 '전화-회화'를 선보였다. 그는 전화로 이미지의 좌표와 색상을 알려주고 제작을 아예 간판 집에 맡겨버렸다. 60년대의 미니멀리스트 토니 스미스 역시 철공소에 전화로 작품의 제작을 의뢰하고 심지어 배달까지 시켰다. 같은 시기에 개념미술가 솔-르위트는 수학 공식만 주고 직공들에게 그 공식에 따라 벽에 도형을 그려나가게 했다.
팝아티스트 앤디 워홀은 아예 '공장'을 차려놓고 조수들에게 작품의 실행을 맡겼다. 대중의 눈에는 이게 이상해 보이겠지만, 사실 이 이상한 관행의 바탕에는 예술에 대한 새로운 '관념'이 깔려 있다. 즉, 어떤 대상을 '작품'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예술가의 '솜씨'가 아니라 '콘셉트'라는 관념이다. 이 새로운 관념을 창조한 사람은 물론 '사인'만으로 변기를 작품으로 둔갑시킨 마르셀 뒤샹이다.
이처럼 예술의 본질이 '실행'이 아니라 '개념'에 있다면 대작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림을 대신 그려준 그 작가도 '콘셉트는 조영남 씨에게 받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뭔가 개운치 않은 느낌이 남는다. 왜 그럴까? 일단 내 심기를 거스른 것은 대작 작가가 받았다는 터무니없이 낮은 '공임'이다. 작품당 10만원 남짓이라나? 자신을 '작가'라 여기는 이에게는 모욕적으로 느껴질 만한 액수다.
문제는 거기에 있다. 조영남은 그 작가가 '노동'을 했고 그 대가로 '공임'을 받은 것뿐이라 믿는다. 반면, 작가는 자신이 '작품'을 했고 그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느낀다. 이 갈등은 대작의 성격에서 비롯된다. 개념미술가나 미니멀리스트, 팝아티스트들이 남에게 작업을 맡길 경우, 맡겨진 그 작업은 대개 기계적'반복적'익명적인 부분에 머문다. 즉, 예술가의 개인적 터치가 느껴질 수 없는 부분을 맡긴 것이다.
대행의 관행이 주로 미니멀리즘'개념미술'팝아트와 같은 특정 영역에 한정된 것은 그 때문이다. 그 관행이 아무 데서나 용인된 것은 아니다. 물론 '화투'를 그린 데서 볼 수 있듯이 조영남은 팝아티스트의 제스처를 취한다. 작품을 판매하는 방식도 '팝'스럽다. 하지만 그가 다른 이에게 시킨 것은 워홀의 경우처럼 익명성이 강한 복제의 작업이 아니라, 그린 이의 개인적 터치가 느껴질 수도 있는 타블로 작업이었다. 여기에는 어떤 애매함이 있다.
또 하나, 미니멀리스트'개념미술'팝아티스트들은 내가 아는 한 작품의 실행을 남에게 맡긴다는 사실을 결코 감추지 않았다. 심지어 워홀은 '나는 그림 같은 거 직접 그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공공연히 자랑하고 다녔다. 남에게 작품의 실행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의 작품 콘셉트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영남의 경우 내가 아는 한 그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다니지 않았다. 여기에 또 다른 모호함이 있다.
물론 작가에게 꼭 그 사실을 밝히고 다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는 여전히 '내 작업의 콘셉트에 대행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아니, 미술사에 대한 막연한 지식에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대행 사실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라면 그의 미학적 관념이 정교하지 못한 것이고, 그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춘 것이라면 그의 윤리적 의식이 정확하지 못한 것이다.
어느 쪽일까? 그건 신만이 아실 것이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것은 이를 따지는 일은 비평과 담론으로 다루어야 할 미학적-윤리적 문제이지, 검찰의 수사나 인터넷 인민재판으로 다루어야 할 사법적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거기에 형법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야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