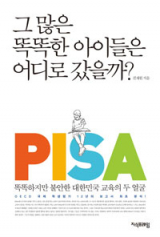
그 말은 똑똑한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권재원 지음/ 지식프레임 펴냄
서울대 사범대학 독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사회교육과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서울대'한국방송통신대'상명대 등에서 사회조사방법론을 강의했으며, 20년 넘게 중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쳐온 저자가 한국교육의 문제점을 색다른 관점에서 분석했다.
2000년 이후 교육계는 3년에 한 번씩 출렁거린다. 바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학생평가(PISA: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때문이다. 전 세계 70여 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 수리, 과학 영역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하고 방대한 교육자료를 수집하는 PISA는 그 나라 학생의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진다. 그런데 한국은 PISA에서 다섯 번이나 최상위권을 지켰지만 학생, 학부모, 교사 어느 누구도 칭찬받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의 미래는 불안하기만 하다. 대체 무엇이 어디부터 잘못된 것일까? 저자는 이를 분석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수천 쪽에 이르는 PISA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을 진단했다.
먼저 경제기구인 OECD가 왜 갑작스럽게 2000년부터 PISA라는 이름의 학생평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OECD가 내세운 명분은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똑같은 것을 배우고, 똑같은 방식으로 시험을 봐서, 똑같은 말 잘 듣는 표준 노동자를 대량생산하던 근대 공교육이 구글과 애플로 대표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탓이었다. 이제 배운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게 됐다. 배운 것보다 배울 수 있는지 여부, 앞으로 새로운 것을 얼마나 잘 배울 수 있느냐가 중요해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85%의 학부모가 자녀의 대학 졸업을 원하지만 60%만이 전문직을 기대한다. 홍콩은 80%의 학부모가 자녀가 전문직이 되기를 기대하지만 60%만이 자녀의 대학 졸업을 기대한다. 독일의 경우 50% 정도의 학부모가 자녀가 전문직이 되기를 기대하지만 35%만이 대학 졸업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대졸자가 많지만 이를 수용할 전문직 일자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홍콩이나 독일은 그 반대라는 현실을 반영하는 셈이다.
다시 말하면 홍콩이나 독일 학부모들은 "내 아이가 전문직이 되고자 한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부모는 "꼭 전문직이 되기를 바라지 않지만,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의 성취 압력은 자녀의 장래에 대한 포부와 기대보다는 '공부 안 하면 먹고살기 어렵다'는 공포와 불안에 기인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학생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PISA(2012년 세계 1위)의 결과는 의외이다. 함정은 평균에 있다. 결과만 놓고 보면, 한국 학생은 미국 학생보다 훨씬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기 싶다. 그러나 정확히 분석해 보면 미국보다 학습 부진아가 훨씬 적어서 전체 평균이 높은 것일 뿐 최상위권 학생의 비율은 미국이 우리보다 5%나 많다. 인구를 감안할 경우 결국 지식정보사회에 필요한 인재는 미국이 훨씬 많다는 뜻이 된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성인에 이르면 더욱 심각해진다. PISA에서 한 번도 5위권 밖으로 밀려나 본 적이 없는 한국이 성인문해력평가(PIAAC: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encies)에서는 OECD 평균인 273점을 얻어 겨우 최하등급을 면했다. 55세 이상을 따로 떼어 분석해보면 결과는 244점으로 더욱 참담하다. '244점'은 '자기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글을 읽고도 그게 자기 이야기인지 알 수 없는 수준'이다. 반면에 대부분의 OECD 국가는 노인과 젊은이 사이에 격차가 거의 없거나 오차범위 정도에 불과하다.
먹고살기 위해 짓눌려 하는 학업으로 불행한 한국 학생과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에 시달리며 평생학습과는 거리가 먼 한국의 성인, 아무래도 전반적인 교육'사회 부문의 혁신이 없는 한 산업사회의 성공모델인 한국이 지식정보사회의 성공모델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271쪽, 1만5천원.
석민 기자 sukmin@ms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