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1912~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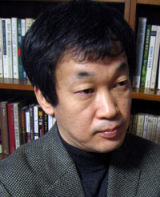
거미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나는 아모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어니젠가 새끼거미 쓸려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나는 또 큰거미를 쓸어 문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어데서 좁쌀알만한 알에서 가제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거미가 이번엔 큰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미나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어나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받어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전문. 『정본 백석 시집』. 문학동네. 2007)
"이 시는 거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급속히 가족 공동체가 붕괴되어 가던 1930년대 후반의 민족적 현실을 그려내고 있다. 자유시이고 서정시이고 서사적이며 상징적. 주제는 붕괴된 공동체 회복에 대한 소망."
이 시를 고르고 나서 인터넷 검색을 하니 온통 수능 특강용 해설이다. 백석의 「수라」는 이러한 의도로 쓰여졌고, 이렇게 읽는 것이 맞다는 것. 그럴듯한 해설이다. 백석도 아마 그러한 의도로 썼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시인이 어떠한 의도로 그 시를 썼든 시는, 그리고 예술 작품은 다양한 해석으로 존재해야 한다. 다양한 해석이 가로막힌 작품은 이데올로기이거나 이데올로기의 화석일 뿐이다.
나는 이 시에서 백석의 착하디 착한 마음과 민족주의와 그것이 가진 폭력성이 겹쳐져 있는 것을 본다. 가족끼리 서로 만나게 해 주기 위한 그 착한 마음은 내부가 존재하지 않는 바깥으로 개개인을 덩어리째 퍼내 버린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허구의 정치 공동체를 연민으로 봉합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관성에 다름 아니지 않을까.
1930년대의 시를 1930년대의 시선으로 읽는 것은 문학 연구자의 몫이다. 학생들에게 문학 연구자의 눈이 아니라 그저 시를 향유하게 할 수는 없을까? 백석의 시는 분명 그 이상이다.
시인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