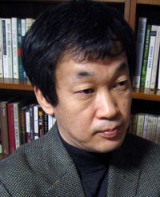
엘리스는 어리고 토끼는 늙었지
시계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녀의 뒷모습에 내가 새겨질 거라는 착각을 해
얼어붙은 장미 한 송이가 녹으면서 식은땀을 흘린다
그녀는 절단된 가시처럼 갈 곳이 없어 내 속에 와 박혔네
이내 분쇄된 얼음처럼 흩어졌네
한밤중, 누군가 창밖에서 큰 소리로 자장가를 부른다
차에 치여 죽은 여자이다
항구와 기차역을 구분하지 못한 숙맥이다
현무암을 혀 밑에 넣는다 물속으로 가라앉는다 기포로 숨을 쉰다
높은 파도일수록 엘리스는 오래 잠을 잔다
(……)
아침, 누군가 눈앞에서 크리스마스 인사같은 재채기를 한다
그녀가 1월에 완벽하게 죽어 있다
그녀가 8월에 최선을 다해 죽어가는 중이다
멀리서 뱃고동이 들려온다
구멍 난 화석 같은 새해가 오고 있었다
(부분. 『문예중앙』. 2015년 봄호)
이 시의 이미지들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철학자 들뢰즈의 표현처럼 "강기슭으로도 밀리지 않으면서 표면에 머물러"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는 쉬워야 하고 이해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시처럼 갖가지 이미지들이 연결되지 않는 모습으로 둥둥 떠 있는 것을 사람들은 불편해한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이러한 지배적 사고 구조는 말 그대로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아닐까? 서사적 스토리를 완성시키려는 강박은 체제를 언제나 항구에 정박시키려는 자기 폭력에 다름 아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도 이 시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난감하다. 이제 갓 등단한 젊은 시인의 시를 미숙함으로 밀쳐놓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이 시인의 시들이 가진 이미지들은 규칙적으로 불규칙하여 미숙함으로 보기는 어렵다. 겨울 항구에서 자신이나 그 누군가에게 보내는 이 「안부」는 쓸쓸하고 고통스럽다. 시인이 시 머리에 옮겨 썼듯이, 들뢰즈는 『카프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편지들은 땅 밑에 박힌 줄기의 세계, 그물, 거미줄이다. 편지들에겐 흡혈귀적 성격이 있다." 시인은, 그 편지를 쓰는 박쥐인 것이다.
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