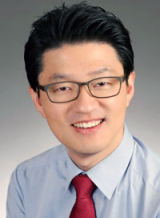
최근 두 가지 소식을 접하면서 착잡한 마음이 앞섰다. 바로 이동찬 코오롱 그룹 명예회장의 별세와 한'중 FTA 타결 소식이다. 두 가지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섬유산업에 대한 고민으로 초점이 맞추어진다.
고 이동찬 회장은 대한민국 섬유산업에 수많은 족적을 남겼다. 그래서 그에게 붙은 별명이 '섬유계의 큰 별' '섬유업계 대부' '섬유산업의 선구자' 등이다. 또 그의 발언에서는 진정한 기업가정신(entrepreneur
ship)을 엿볼 수 있다.
"기업은 나 개인의 것이 아니다. 종업원 모두의 사회생활 터전이며 원천인 것이다. 기업의 부실은 사회에 대한 배신이며 배임이다."(1981)
"기업은 국가 경제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원천이고 직장인의 생활터전이다. 후손에게 풍요로운 정신적'물질적 유산을 남겨놓아야 한다는 건 기업가의 사명이다."(1987)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시절, 불모지인 대한민국에 사명감과 기업가정신으로 섬유를 일궜던 섬유업계의 큰 별이 지면서, 그의 기업가정신이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아 몹시 아쉽다.
한'중 FTA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한'중 FTA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중의 하나가 바로 섬유다. 과거 섬유는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이었다. 1980년 주요 수출상품 가운데 의류(27억7천8백만 달러)가 단연코 1위였다. 2위인 철강(9억4천5백만 달러)과는 3배 정도 차이가 났고, 3위도 신발(9억800만 달러)이었다. 1980년에 섬유수출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의 섬유는 어떠한가? 브랜드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등에 밀리고, 생산원가 면에서는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비해 경쟁력을 잃고 말았다. 그런데 한'중 FTA라니….
필자가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활동하던 때의 이야기다. 2005년 즈음 섬유업계 대표들은 매일같이 국회를 찾아 섬유업계의 위기를 설명하고, 국가적 지원을 통해서 섬유를 살려야 한다는 설득에 주력했다. 필자도 이 주장에 귀를 기울였다. 그 결과 국회에서는 「섬유산업 구조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안」(2006)과 「지식기반 신섬유개발 촉진법안」(2009)을 제정해서 섬유업계에 대한 지원을 시도하다가 정부 측의 반대에 부딪히고 만다. 그러면서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사업(1천4백억원)' 'DTC건립 사업(1천2백억원)' '섬유산업스트림 간 협력기술개발사업(3백억원)' 등을 통한 예산지원으로 섬유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게 된다.
비슷한 시기, 막강한 유통채널을 가진 국내 대기업인 L기업은 일본의 유니클로(2014년 예상매출 15조원, 국내 매장 133개)와 한국에 공동회사를 설립하고, 일본의 유니클로 제품을 수입해서 파는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된다. 한국의 의류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L기업과 패스트패션 의류를 생산하는 일본기업의 궁합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기대 이상으로 장사가 잘되자, 2011년 11월 11일 명동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매장을 개장하고, 하루 매출액이 12억 원을 넘어서는 대기록 세운다.
정부와 국회는 수천억 원을 들여서 섬유산업을 살리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L기업은 일본 섬유산업 배를 불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L기업의 이윤 추구를 탓만 할 수 없겠으나, 소위 '기업가정신'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지금 섬유업계가 필요한 것이 바로 '기업가정신과 혁신'이다. 바로 고 이동찬 회장의 '기업가정신'이 절실한 때이다. 또 한'중 FTA의 위기 속에서 '혁신'이 필요한 때이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기업가정신'을 자극하고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시의 적절한 섬유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그러면 대구섬유도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손강호/전 국회의원 보좌관·기술경영학 대학 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