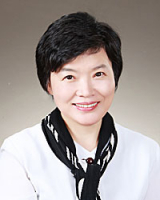
삼성 그룹이 대구'경북과 함께 옛 제일모직 터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운영하기로 한 지 한 달 째다. 삼성이 기업을 시작한 옛 제일모직 터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짓는데 메모리얼 파크(기념공원)를 포함해서 수천억 원 내지 조 단위 투자를 할 것이라는 소문과는 달리 대구에 풀어놓을 초기 투자 규모는 '1천억 원'에 그친다.
그것도 절대액(900억 원)이 제일모직 터에 들어설 각종 시설에 대한 투자이고, 정작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갈 창조경제 붐업을 위한 기금으로 투입될 예산은 100억 원에 불과하다. 대구시가 매칭으로 1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니 합쳐서 200억 원에 불과하다. 아무리 삼성이 어닝쇼크에 빠졌다지만, 스스로 민망한지 최근 100억 원 추가 투입을 발표했다.
삼성이 대구'경북의 창조경제 혁신센터에 쏟아붓겠다는 초기 마스터플랜은 오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온 냄새를 풍기고 있다. 그렇지만 지역민들은 삼성이 삐칠까 봐 맘놓고 비판도 못하고 있다. 그저 숨죽여 위기의 삼성이 대구'경북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낼 과감하고 신속한 창조적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는 희망 섞인 기대를 품고 있을 뿐이다.
정작 속마음은 "삼성 뭐지, VIP와 동행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오픈해놓고 겨우 이게 다야"하는 게 대부분 대구시민들의 정서이고, 경상북도는 왜 전국 타시도는 각 광역정부마다 하나의 대기업과 매칭이 되는데 대구'경북은 삼성그룹 하나만 바라보느냐며 불만이 목까지 차있다. 물론 대전'세종시 두 광역정부도 SK그룹 한 곳이 같이 지원하지만 대구'경북 600만 경제권과 이제 160만 인구에 불과한 대전'세종시 권역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실질적인 투자규모는 삼성보다 SK그룹이 서너 배 더 크다. 삼성이 평택에 15조를 쏟아붓는 것이나, 중국 시안에 7조 원대 시설 투자를 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SK의 대전'세종시와 비교해서도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삼성은 프리미엄 휴대폰으로 잘 나가던 모바일 부문이 레이쥔 회장이 이끄는 중국 좁쌀 그룹 샤오미(小米)에 추격당했고, 미래에 대한 투자 면에서는 도요타 고세이를 못 따라가는 형국이다. 도요타 고세이는 청색 LED로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일본 나고야대 아카사키'아마노 교수 등에 대해 30년이나 소리소문없이 무한 뒷받침을 했다.
'잘난 삼성'이 고비를 넘어 새로운 역사를 쓰려면 또 다른 3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열린 귀이다. 법무팀만 1천 명이 넘는다는 삼성은 도요타 고세이가 젊은 직원의 현장 의견을 듣고 일사천리로 청색 LED 사업에 대한 투자를 신속하게 결정하여 성과를 냈듯이 과거 100년의 정보가 하루에 다 생성된다는 빅데이터 시대에 걸맞은 열린 귀가 있어야 한다. 한때 등소평의 죽음을 삼성이 국정원보다 더 먼저 보고했던 것처럼 삼성은 숨 가쁘게 발전하고 있는 현장의 조악하지만 살아 꿈틀대는 기류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융합 정신이다. 한때 삼성은 유럽 가전시장의 한쪽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쓴 채 잘 팔리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 그걸 소비자들의 니즈 수렴과 서비스 개선으로 차고 나갔다. 지금 샤오미는 휴대폰을 만들지만 매주 금요일마다 오렌지 프라이데이를 통해 각종 민원을 접수하고 그 해결 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연결해나가는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삼성도 이제 모바일 제조업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모바일에 다른 서비스를 연결해 완전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가야 한다.
나머지 하나는 삼성이 교육문화도시인 대구'경북의 잠재력에서 새로운 문화사업의 기반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신뢰와 원칙으로 기업을 반석 위에 올렸다면 지금은 퇴원을 준비할 정도로 호전됐다는 이건희 회장은 믿음과 신뢰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다. 서울대 동양사학과 출신인 이재용 부회장은 창조의 근원인 대구'경북의 문화를 기업에 접목해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자형 허순구 씨는 대구 금호강변에 풍류방을 운영하면서 악보를 남긴 문화인이며, 대구시립무용단 박현옥 감독은 삼성가의 집안이지만 다른 집안 사람들과는 달리 단 한 번도 삼성가를 언급하며 손 벌린 적이 없이 독자적인 예술영역을 개척해왔다. 정부가 국정 기조로 내세운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는 삼성과 대구'경북이 그 어느 곳보다 이뤄내기에 적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