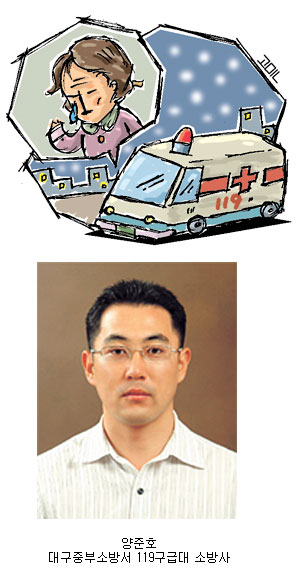
이번 겨울은 나에게는 유난히 가슴 아프고 시린 겨울이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야간에 출근해서 언제 있을지 모를 구급 출동에 대비하여 구급차량과 장비를 점검하고 닦으면서 꼼꼼하게 챙기던 중이었다. "삑삑~삐비빅" 때로는 친근하고 가끔 너무 힘들 때는 지겹게 느껴지는 신호가 들려온다. 도로에 쓰러진 환자가 있다는 구급 출동이었다.
다행히 가까운 거리라 출동 5분을 넘기지 않고 현장에 도착했다. 환자로 보이는 할머니가 폐박스와 파지를 잔뜩 실은 리어카를 세워 놓고 담벼락에 기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나는 할머니에게 119구급대원임을 알리고 어디가 불편한지 물었다.
할머니는 나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일어서서 우리를 피해 골목길 안으로 폐박스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움직이려 했다. 난 할머니를 붙잡으며 도와 드리러 왔다고 했다. 할머니는 다시 나를 쳐다보더니 아픈 데 없으니까 그냥 가라며 다시 힘겹게 움직였다. 나는 그냥 가려고 일어서는 할머니 손을 붙잡았는데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마도 이 추운 겨울에 폐박스를 줍느라 하루종일 맨손으로 일을 하신 것 같았다. 할머니에게 다시금 말을 걸었다.
"그럼, 할머니 날씨가 꽤 추운데 저기 구급차 안이 따뜻한데 몸이라도 좀 녹이고 가세요~ 네?" 나는 할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날씨가 상당히 추웠고 내가 그냥 포기하지 않을 걸 아셨는지 알겠다고 하시면서 구급차 쪽으로 선뜻 걸음을 옮기셨다. 아니면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그리웠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할머니를 부축하고 구급차 안에 들어와서 혈압계를 자연스럽게 할머니 팔뚝에 감으면서 아프거나 불편하신 데가 있는지 물었다. 혈압은 조금 높은 수치를 보였다. 혈압이 조금 높은데 평소 드시는 혈압약이 있는지, 통원 치료는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였다.
보호자는 있는지, 혼자 사시는지도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갑자기 할머니가 눈물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나 위암 말기인데 지금 혼자 살아…." 나는 편하게 생각하고 다른 아픈 곳이 또 있는지 다 말씀해 보시라고 했다.
할머니는 "위암도 있고 혈압도 높고 지금 폐암도…, 암이 번졌다고 병원에서 얘기했어~." 작은 충격.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암이 전이된 것이었다. 이 좋은 세상에 이렇게 힘들고 불쌍한 인생을 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에게 지금 어느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지 여쭤봤다. 지금은 병원에 다니지 않는다는 대답이다. 왜 병원에 다니시지 않는지 다시 여쭤봤다. 잠시 침묵하던 할머니가 갑자기 참았던 눈물을 쏟아 내신다. "실은 내가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약도 못 사먹어."
'아! 내가 참 바보 같은 말을 할머니에게 했구나.' 갑자기 할머니가 측은하게 느껴졌다. "할머니~ 병원 안 가신 지, 약 안 드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혹시 오늘 식사는 하셨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셨다.
할머니에게 혹시 가족이 있는지 물어봤다. 할머니는 딸이 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며 몇 년 전에 집을 나갔다고 얘기했다. 다시 말없이 고개를 숙여 눈물을 흘리시는 할머니에게 나 또한 말이 잠시 없어졌다.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아프게 저려왔다.
"저기, 할머니! 혹시 대불제도라고 아세요? 치료비가 없는 환자들에게 나라에서 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돈이 있을 때 조금씩 갚아 나가면 되는 제도인데, 병원 가서 치료 먼저 받으시고 나중에 할머니가 돈 생길 때 조금씩 갚아나가면 되세요. 혹시 아세요?"
할머니는 "하루에 폐지 주워서 3천원, 4천원 버는데 내가 빚을 지면 무슨 수로 갚아?" 하시면서 계속 눈물을 훔치신다. 가슴이 뭉클하면서 할 말이 없어졌다. 또한 할머니는 호적상 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나라에서 매달 나오는 돈도 못 받는다고 하셨다.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얘기하신 모양이다. 어떻게든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나 자신에게도 화가 났다.
그 할머니를 보면서 돌아가신 내 할머니가 갑자기 너무나도 보고 싶어졌다. 내 할머니도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폐암으로 돌아가셨던 게 생각났다. 그 할머니가 내 할머니처럼 느껴졌던 것일까. 나는 주섬주섬 내 주머니에 있던 3만원을 꺼내 할머니 손에 쥐여 드리면서 "할머니~ 지금 제 주머니에 이거밖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식사도 못 하신 것 같은데 따뜻한 밥이라도 꼭 드세요, 아셨죠?" 할머니는 한사코 거절을 하신다. 나는 거의 막무가내로 할머니 주머니에 돈을 넣어 드렸다.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 가기를 거부하시는 할머니. 돈이 없어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는 할머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며 추운 겨울에도 폐박스를 줍고 계셨던 할머니. 그 할머니가 아직도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양준호 대구중부소방서 119구급대 소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