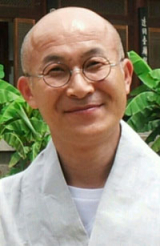
흔히 대구 지형을 가리켜 분지(盆地)라고 한다. 대구는 뒤쪽의 팔공산과 앞쪽의 비슬산에 둘러싸여 있는 산악도시인 셈이다. 팔공산이 활달한 남성적인 산이라면 비슬산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여성적인 산이다. 비슬산은 달구벌에 앞산 자락을 펼쳐놓고 대구 남쪽을 비상하는 한 마리 고고한 학과 같다. 낙동강을 젖줄 삼아 해발 1,084m로 솟아있는 명산(名山) 중의 명산인 것이다.
비슬산은 산 이름부터 예사롭지가 않다. 신라시대에 인도 스님들이 와서 산을 보고 감탄하여 '비슬'이라 이름하였다고 전해진다. 고대 인도의 신 '비슈누'(Vishnu)의 범어(梵語) 발음을 그대로 소리로 옮겨 한자로 표기한 '비슬노'(琵瑟怒)에서 유래한 것이다. 비슈누는 '덮는다'라는 뜻이 있어 이를 한자로 쓰면 포(包, 苞)가 되어 지금도 포산(包山, 苞山)으로 쓰이곤 한다. 또한 일연은 '삼국유사'에 주(註)를 남겨 '그 지역 사람들은 소슬산(所瑟山)이라고도 불렀다'고 적고 있다. '소슬'(솟을)은 '우뚝하다' '높다'라는 것이니, 비슬산은 '우뚝하니 높이 솟아 주변을 끌어안고 덮어주는 어머니와 같은 산'이라는 뜻의 해석이 가능해진다. 결국 비슬산, 포산, 소슬산은 같은 의미의 이름이 되는 것이다.
비슬산 대견봉, 그 넓은 산정의 남쪽 아래 해발 1,000m 고지에 대견사지가 있다. 석양이 장관인 서편으로 황금빛 낙동강이 흐르고 풍요로운 달성 들판과 첩첩 산등성이가 발아래로 펼쳐지는 명당 중의 명당 터다. '명산에 절을 세우면 국운이 흥한다'는 산천비보사상(山川裨補思想)에 따라 신라 헌덕왕 때 이곳에 절이 창건되었다. 그래서인지 본래 이름이 보당암(寶幢庵)이었던 대견사는 늘 곡절의 한반도 역사와 운명을 함께했다.
1402년(태종 2)에 대제학 이첨(李詹)이 국운을 기원하며 보당암을 중창하였는데, 1416년(태종 16)과 1423년(세종 5)에 이 절의 장육관음석상(丈六觀音石像)이 땀을 흘린다고 조정에까지 보고되어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다. 임진왜란 때는 낙동강을 통해 북상하는 왜군에 의해 불탔고, 1900년 대한제국의 융성을 위해 대견사를 중수하여 동화사 말사로 편제했다. 그러나 결국 '대견사가 대마도의 기를 꺾는다'는 이유로 일본에 의해 1917년 강제 폐사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토록 국운을 함께했던 대견사가 거의 100년 만에 다시 중창되고 있다. 달성군 개청 100주년에 맞춰 내년 3'1절에 다시 호국사찰 대견사의 문을 열게 된다. 이는 단순히 일개 사찰 건립의 차원을 넘어 민족정기를 되살리고자 하는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과 지역 발전에 노심초사하는 김문오 달성군수, 이 두 분 원력의 결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싶다. 마침 오늘(2013년 9월 14일)이 대견사 대웅전 상량식 날이다. 하늘에 닿은 절, 비슬산 대견사가 다시 그 문을 활짝 열고 하늘과 땅을 이어 온누리에 광명을 비추리니….
지거스님 동화사 부주지·청도 용천사 주지
yong1004w@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