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상추에 보리밥 한 술과 된장…입안이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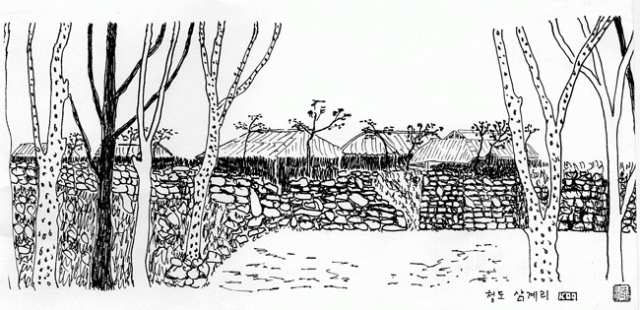
언 땅을 헤집고 상추씨를 뿌렸다. 아직 봄의 기척은 먼데 흙 홑이불을 덮어쓴 씨앗들은 일어날 기미가 없다. '잔류하겠다'는 겨울과 기어코 '밀어내고야 말겠다'는 봄의 전투가 서너 차례 반복되었지만 지하 벙커에 숨어 있는 씨앗들은 얼굴 한 번 내밀지 않는다. 에고의 극치다. 밤에는 겨울 편이 되었다가 낮에는 봄 패거리가 되곤 한다. 한국전쟁 때 산골마을 사람들이 밤에는 빨갱이들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낮에는 국군들의 시중을 드는 것과 똑같다.
우리 집은 맨 꼭대기 층이어서 하늘과 맞닿아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리시버를 끼지 않고 생으로 들을 수 있다. 나무 사다리를 타고 옥탑방으로 올라가 문밖으로 나가면 하늘 아래 거실 크기의 옥상이 시멘트 맨살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부부는 그 공간을 푸르게 가꿀 요량으로 고무 함지박을 올려 텃밭을 만들었다. 동네 골목을 돌아다니며 개구쟁이들이 함부로 발로 차는 연탄재를 주워오고 산자락의 부엽토를 긁어와 제법 쓸 만한 밭으로 일구었다. 우리 집 옥상 텃밭은 주말농장이 아니라 심심하면 올라가는 '심심농장'이다.
나는 어릴 적부터 상추쌈을 좋아했다. 상추쌈은 잎의 크기가 옛날 기차표만할 때 먹는 것이 가장 맛있다. 그렇게 하려면 씨앗을 많이 뿌려 새순들이 잔디처럼 촘촘하게 돋아나도록 해야 한다. 어머니는 씨를 뿌릴 때마다 "상추씨는 달게 뿌려라"고 하셨다.
소쿠리에 가득 담긴 어린 상추를 먹을 때는 손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득 올려놓아야 한다. 그 위에 보리밥 한 술에 낟알이 듬성듬성한 노란 날된장을 얹어 입이 터지도록 밀어 넣으면 행복이 별것 아니란 걸 째진 입이 먼저 알아차린다. 때론 상추가 너무 많아 입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더 많을 때도 있다. 밥상 위에 떨어진 이삭이 더 맛있다.
요즘은 아침저녁으로 상추쌈만 먹는다. 뿌리에 잔털이 나지 않은 아주 어린놈들은 무 순 먹듯 뿌리째 먹는다. 함지박마다 일주일 간격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기차표 상추는 초여름이 올 때까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우리 집 옥상 상추농사는 우리 내외의 입만으론 감당하기가 어려워 아내는 친구들에게 퍼 나르느라 봄날 해가 짧다.
아침저녁으로 텃밭을 오르내리다가 문득 조기 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달았다. 만약 일찍 언 땅에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맛있는 어린 상추 맛을 볼 수 있었을까. 교육감의 뇌물공여로 아직도 시끌벅적한 서울시교육청에 참교육 교재용으로 상추씨 한 봉투를 퀵서비스로 보낼까 보다.
봄 미나리는 향기롭다. 봄을 압축한 대표적 식물 표본이 미나리인 것 같다. 푸른색 줄기보다 붉은색 줄기의 미나리가 훨씬 향이 강하다. 논에서 재배한 것보다 아무렇게나 자란 밭미나리가 더 맛있다. 삼겹살을 구워 생미나리 쌈에 싸서 먹으면 좋은 영화 한 편 보는 것 이상이다. 생미나리는 한계가 있다. 볼이 미어터지도록 몇 번 쌈을 싸 먹으면 더 먹고 싶은 맘이 없어진다.
어머니는 미나리강회를 잘하셨다. 펄펄 끓는 물에 미나리를 잠시 담갔다가 건져내면 풀은 죽었는데 아삭한 맛은 그대로다. 줄기를 몇 번 접어 이파리 부분으로 허리를 동여매면 많이 먹어도 물리지 않는 강회가 된다. 요즘은 맛있는 식초가 다 나왔지만 그 옛날에는 독한 공업용 식초를 슬쩍 뿌린 초고추장에 찍어먹으면 꿀맛이었다.
대구 불로동에 단산지를 끼고 있는 봉무공원에 아내와 함께 산책을 갔다가 아직 덜 자란 미나리를 샀다. 피곤에 지친 듯한 초로의 영감님이 낫 한 자루를 쥐고 못둑에 앉아 있었다. "미나리 좀 사 가시오." "미나리가 어디 있어요." "저 아래 둑 밑의 푸른 논이 미나리꽝 아니오." 아내는 5천원 어치를 샀다. 이름난 미나리 단지의 1만원짜리보다 더 많았다. 아내는 물건을 싸게 살 때마다 입이 찢어져 눈이 작아 보인다.
그날 저녁은 미나리 쌈으로, 다음 날 아침은 미나리 비빔밥으로, 점심은 미나리강회를 초고추장에 찍어 먹었다. 밤에는 '더 부러더스 포'가 부른 '그린 필더'를 듣고 따라 불렀다. 그들은 미나리 밭에 서서 이 노래를 불렀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
수필가 9hwal@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