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릴 것 없고 관혼상제에 꼭 필요한 국민생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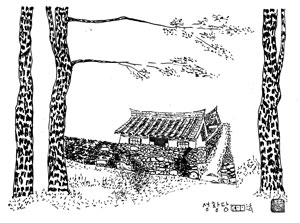
젊은 화가 셋이서 보름밤에 만나는 계모임을 결성한 적이 있다. 모임 장소는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아틀리에 옆 미복개천 옆 공터였다. 화실 주인이 수채 냄새가 나는 하수도를 연탄집게로 물꼬를 터 물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도록 만들었다.
그들은 그 모임을 '미라보 시사'(詩社)라고 명명했다. 달 밝은 밤이면 그들만의 미라보 다리 옆에 모여 북어포를 찢어놓고 소주잔을 기울였다. 박인수와 이동원이 부른 '향수'를 불렀고 양명문의 시를 오현명이 노래한 '명태'도 자주 불렀다.
옛 선비들의 정자 모임 '시사'
시사는 옛 선비들의 정자모임을 말한다. 모이는 날 회원들은 술과 안주를 들고 와 시를 짓기도 하고 읊기도 하며 도도한 흥취에 빠지곤 했다. 초계문신이었던 다산 선생도 열다섯 벗들을 모아 죽란(竹欄) 시사를 만든 적이 있다.
살구꽃 피면 만나고 복숭아꽃 피면 모인다. 참외가 익고, 연꽃이 피면 만난다. 국화가 향기를 뿜으면, 또 큰 눈이 내리면 여럿이 한 식구처럼 어울린다. 그리고 매화가 꽃망울을 터트리면 모두 모인다. 공식 모임은 일곱 번이지만 아들을 낳거나, 벼슬이 높아지거나, 지방의 수령으로 나가거나, 자제가 과거에 급제하면 모여 잔치를 벌여 축하하곤 했다.
시인 문태준은 '벌레시사'라는 시에서 "밭은 나와 벌레가 함께 쓰는 밥상이요 모임이 되었다/ 선비들의 정자모임처럼 그럴듯하게/ 벌레와 나의 공동 소유인 밭을 벌레시사라 불러주었다"고 노래하고 있다. 밭에 나는 채소를 내가 먹고 벌레도 함께 먹으니까 벌레와 나를 공동체의 가족과 같은 개념으로 본 것이다. 시인의 아름다운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렇듯 시사라는 명칭의 모임은 그 구성원들의 뜻이 맑기 때문에 굳이 사람이 아니라 가축이나 벌레까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 서넛과 추풍령 쪽으로 등산을 간 적이 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눈보라가 날려 앞뒤를 분간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배까지 고팠다. 점심은 꽁꽁 언 김밥 몇 조각밖에 없었다.
장승 옆에 걸린 명태로 찌개 끓여
길가 돌장승이 서 있는 바로 옆에 허름한 헛간 같은 게 눈에 띄었다. 이 동네의 상여집이었다. 송판 몇 조각을 바람막이로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장승 옆 소나무 옹이에 마른 명태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게 보였다. 장난 좋아하는 친구가 그걸 벗겨와 "추운데 이거라도 끓여먹자"고 제의했다. 나머지 친구들이 대답을 하지 않자 암묵적 동의라고 생각했는지 꼬리를 잡고 대가리로 돌장승 귀때기를 후려쳤다.
머리가 떨어져 나가자 명태를 반으로 분질러 코펠에 담아 불을 붙였다. 인가가 그리 멀지 않은 덕에 된장과 김치를 얻어와 명태찌개를 끓여먹은 기억이 아련하다. 이제 생각해 보니 그 명태는 어느 아낙이 "아들 낳게 해 달라"며 돌장승에게 갖다 바친 제물이 분명한데 아무런 동의 없이 끓여먹고 언 몸을 녹였으니 우리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진 듯하다.
그러니까 시인이 자신의 채마밭을 '벌레시사'라 부르듯 우리의 추풍령 돌장승 주변에서 있었던 추억 한 자락을 '명태시사'라 불러도 좋으리라. 나도 그 때부터 돌장승 형님과 호형호제할 수 있는 경배받고 추앙받는 벅수나 장승급 인사가 되었으니 말이다.
어머니는 명태가 생기면 아주 소중하게 다루셨다. 대가리와 뼈는 된장 끓일 때 넣었고 껍질은 모아두었다 살을 조금 섞어 명태장떡을 구웠다. 그리고 살은 잘게 찢어두었다 누가 몸살로 앓아누우면 명태국을 끓여 입맛을 돌려주었다.
국민가수 국민배우란 말이 있듯이 명태는 명실공히 국민생선이다. 제사를 지낼 때나 무당이 굿할 때나 전통 혼례를 올릴 때나 마른 명태가 올라가지 않고는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명태는 대가리에서 꼬리 끝까지 버릴 게 없다. 이만하면 국민들에게 추앙받아 마땅하다. 내가 자주 오르는 팔공산 중턱 벼락 맞은 나무에 해묵은 명태 한 마리가 걸려 있다. 올겨울 눈보라 치는 날을 잡아 명태찌개를 끓여먹으면 어떨까 싶다.
수필가 9hwal@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