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 배 채우지 못해도 단맛에 끌렸던 간식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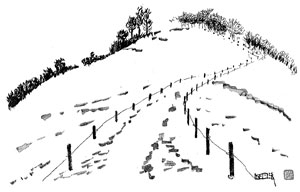
진달래꽃이 지게를 타고 산에서 내려오면 봄은 한창이다. 앞집 태분이 아버지는 아침 일찍 대나무 도시락에 보리밥을 꾹꾹 눌러 담아 나무하러 산으로 올라간다. 깔비(마른 솔잎) 한 짐에 지는 해를 덤으로 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지게에는 항상 진달래꽃이 넌출넌출 춤을 추었다. 진달래 다발을 장독대의 물 담긴 옹추마리에 꽂아 놓으면 꽃잎이 싱싱해져 다음날 태분이의 간식거리가 되곤 했다.
농촌의 봄은 긴 겨울보다는 그래도 나았다. 고픈 배를 달래줄 밭두렁의 '삐삐'(삘기의 사투리)도 있었고 달착지근한 단물을 머금고 있는 찔레도 있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주린 배를 채워주지는 못했다.
진달래 역시 많이 먹으면 뱃속만 쓰릴 뿐 위장이 안락해지는 음식은 아니었다. 그래서 소월 시인도 '아름 따다 가실 길에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도록' 진달래를 뿌리기만 했지 그 꽃을 따먹었다는 시는 남기지 않았다.
##많이 먹으면 뱃속만 쓰려
두 살 아래인 태분이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학교에 다녀와 몽당연필에 침을 발라가며 숙제를 하고 있으면 삽짝을 밀고 그 여자아이가 찾아온다. 그때는 '오빠'라는 호칭이 요즘처럼 범람하지 않은 시절이어서 그냥 말없이 들어선다. 여느 때처럼 손에는 진달래꽃이 들려 있다.
그 아이는 진달래를 눈요기용으로 들고 온 게 아니라 요깃거리 음식으로 들고 온 것이다.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이웃 오빠뻘 머슴애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곤 그것밖에 없었기에 자신이 먹고 싶어도 먹지 않고 아껴둔 것을 갖고 온 것이다. 며칠 전 그 아이가 갖고 온 진달래를 먹고 설사를 한 적이 있어 "인자 니가 갖고 오는 꽃은 안 묵는다. 알겠제"하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그날 진달래 꽃묶음을 치마 뒤로 감추며 눈물이 그렁그렁했던 태분이의 슬픈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그날 태분이가 받을 마음의 상처는 생각하지 못했다. 사랑을 사랑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존심 때문에 그 아이는 밤새 속이 상해 잠을 설쳤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난 태분이는 지게를 메고 산으로 향하는 아버지에게 "다시는 진달래꽃을 꺾어 오지 말라"고 부탁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수줍게 건넨 사랑의 증표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다. 나뭇짐을 지고 언덕에서 떨어져 무릎을 다친 그 아이의 아버지는 나무를 하기 위해 더 이상 산으로 갈 수 없었다. 푸줏간의 막일꾼으로 일하다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태분이는 식모살이를 하러 도시로 가는 어미와 함께 고향을 떠났지만 아무도 그들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내가 중학에 진학하고 한참 뒤에야 태분이가 내게 갖다 준 진달래 꽃묶음이 사랑의 증표였음을 어렴풋이 알게 됐다. 그러나 "인자 니가 갖고 오는 꽃은 안 묵는다"고 한 배신의 막말이 가슴에 못이 되는 평생의 한으로 남지는 않았는지 그게 궁금하다.
##"진달래꽃은 벙어리처럼 붉었어라"
"그해 봄 결혼식 날 아침 네가 집을 떠나면서 나보고 찔레나무 숲에 가보라 하였다. 나는 거울 앞에 앉아 한쪽 눈썹을 밀면서 그 눈썹자리에 초승달이 돋을 때쯤이면 너를 잊을 수 있겠다 장담하였던 것인데, 나는 기어이 찔레나무 숲으로 달려가 덤불 아래 엎어놓은 하얀 사기 사발 속 너의 편지를 읽긴 읽었던 것인데 차마 다 읽지는 못하였다.(중략) 세월은 흘러 타관을 떠돌기 어언 이십수년, 어쩌다 고향 뒷산 그 옛 찔레나무 앞에 섰을 때 덤불 아래 그 흰 빛 사기 희미한데 예나 지금이나 찔레꽃은 하 어라 벙어리처럼 하 어라 눈썹도 없는 것이 꼭 눈썹도 없는 것이."
송찬호의 '찔레꽃'이란 시를 읽고 있으면 진달래와 찔레의 이미지가 겹쳐 혼란스럽다. 시 속의 신부 얼굴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태분이 얼굴이 오버랩되어 나를 미치게 만든다. "진달래꽃은 붉었어라 오! 벙어리처럼 붉었어라."
수필가 9hwal@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