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맞춤법 개정안 20돌 현주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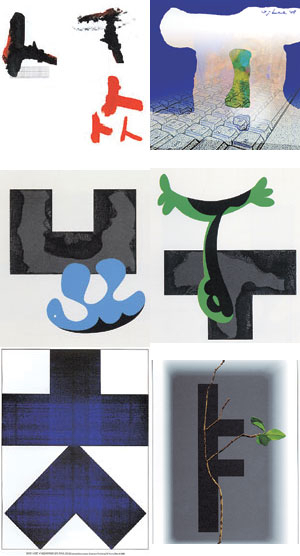
민족의 문자인 한글은 창제 당시부터 표의문자인 한자와 경쟁해 왔다. 근대화 이후엔 수많은 외래어의 홍수 속에서 민족의 얼과 혼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지금에 이르렀다. 특히 올해는 세종 28년(1446년)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인 훈민정음(訓民正音)이 반포된 지 553년째이자 주시경 선생을 주축으로 한 조선어학회의 한글맞춤법통일안(1933년)이 제정·공포된 지 66년이 됐다.
매일신문은 지령 2만호를 맞아 20년 전 1989년 3월 1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의 국어환경에 가장 가까운 어문규정으로 고시·시행된 '한글맞춤법 개정안'이 현재의 바뀐 언어 환경 속에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또 표기법의 혼란과 난맥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현주소를 짚었다.
◆외래어 표기의 불일치
현재 국어표기 관련 최상위법은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 이에 따르면 모든 한글표기의 원칙은 1989년 제정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4대 어문규정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들 어문규정은 한글표기의 절대적 기준이라기보다 관습적 구속력만을 갖고 있다. 게다가 제각각 개정과 제정시기가 달라 통일성이 결여돼 한글표기의 혼란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 문화와 신지식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요즘, 아직 한글로 완전 정착하지 않은 외래어의 경우 표기에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Contents'의 경우 철자표기는 '콘텐츠'이지만 발음표기는 '컨텐츠'가 맞다. 따라서 각종 출판물과 인쇄물에서는 이 둘을 혼용하는 경우가 잦다.
본래 소리글자인 한글로 쓴 외래어는 그대로 읽었을 때 이 말을 알고 있는 외국인 또한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 언어환경 속에서는 이 원칙이 통하고 있지 않다. 또 한글을 아는 외국인의 경우 동일한 단어의 발음표기와 철자표기가 혼용될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모호하게 될 소지도 없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외래어 표기법의 기준은 IPA(국제음성학협회·International Phonetic Association)의 전 세계 모든 음소를 기호화한 발음전사원칙을 따르고 있으나 영어의 th발음인 θ와 ð나 중국어의 권설음, 프랑스의 R 발음 등은 국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음소인 탓에 이를 정확하게 소리나는대로 표기하기란 곤란하다. 게다가 한글맞춤법 제3항에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을 따라 적는다'고 해놓고 외래어 표기법을 찾아보면 제5항에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4대 어문규정 간 다른 기준이 적용돼 표기에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 혼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숙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교문서나 외국 출판물에 적힌 '독도'의 로마자 표기를 보면 'Tokto', 'Dokdo', 'Dok-do'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기법만 7, 8개가 된다. 또 '대구'를 'Taegu'나 'Daegu'로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독도' 이외 그와 비슷한 이름의 섬이 여러 개 있는 줄로 착각할 수 있으며 '대구' 역시 대구 이외 '태구'란 도시가 있는 걸로 알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더더욱 한글의 로마자 표기는 혼란이 있어선 안 되는 사안이지만 실제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홍보물엔 이처럼 로마자 표기가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특히 성씨(姓氏)와 관련해서 여권 등에 나타난 난맥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강'씨를 표기하는 'Gang'이나 'Kang' 등은 외국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른 성씨로 여겨지기 일쑤일 뿐 아니라 '곽'씨와 같이 이중모음의 성씨는 로마자로만 최대 90여 가지로 표기되고 있다고 한다. 로마자 표기법을 우리 음운체계에 맞춰 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로마자 표기법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위한 표기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자 표기법에서 표기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국어의 된소리(ㄲ, ㄸ, ㅃ, ㅆ, ㅉ)와 유기음(ㅋ, ㅌ, ㅍ) 등은 혼란을 부르고 외국인들이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딜레마는 또 있다. 이제까지 많은 외국인들이 알고 있는 한국의 로마자 지명이나 도시명을 섣불리 고치려든다면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 외교통상부의 경우 고작 여권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명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자체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로마자 표기법은 도로표지판, 출판물, 국제적 신인도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총괄적, 학술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은 국어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헷갈리는 띄어쓰기와 사이시옷
한글맞춤법에서 가장 명백한 모순은 띄어쓰기 문제이다. 현행 고등학교 국어검정교과서에 나오는 단어 중 얼굴의 코 안을 지칭하는 '코속'과 오장육부가 들어 있는 '배속'과 같이 안을 뜻하는 '속'자는 붙여 쓰면서 '바다△속'은 띄어 쓴다.
또 '띄어쓰기'는 붙이면서 '붙여△쓰기'는 띄어 써야 바른 표기가 된다. '동해', '남해', '서해', '북해'는 붙이면서 '에게△해'는 띄어 써야 한다. 그 까닭은 한자조어인 '동해' 등은 붙이지만 외래어인 '에게'와 한자어인 '해'(바다)는 원칙에 따라 띄어 써야 한다는 것이다. '봄△바람', '가을바람', '여름△바람', '겨울바람'도 띄어쓰기와 붙여 쓰기가 계절마다 다르다. 여름철 땀을 많이 흘려 옷이 젖은 후 말라서 옷에 하얗게 생기는 얼룩을 일컫는 '소금△꽃'을 우리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보이질 않는다. 왜냐하면 '소금△꽃'은 북한어로 우리 표준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이시옷 문제도 사정은 같다. '대폿값', '꼭짓점'처럼 한자어와 우리말이 한 단어로 될 경우 사이시옷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언어 환경 속에선 '대폿값'보다 '대포값'으로, '꼭짓점'보다 '꼭지점'으로 읽고 적는 것이 훨씬 편하다. 특히 학술적인 전문용어는 하나의 덩어리말로 수입된 뒤 단어별로 띄어쓰기를 함으로써 개념의 혼선을 빚기도 한다.
◆바른 국어어문환경 조성을 위한 대안
가뜩이나 온라인상의 악성댓글이나 축약 또는 생략어가 늘고 있고 외래어 및 외국어 학습의 범람으로 국어사용이 어지럽게 되는 마당에 국어정책이 일관성을 띠지 못하면 외국인들의 우리말 혼동은 물론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 따라서 한글의 우수성과 국어의 건강한 어문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표기의 난맥상과 용어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경북대 인문대학 이상규 교수(국어국문학)는 "외래어 표기는 마땅히 국어심의위원회의 표기법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지금까지 허술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외래어 표기의 경우 발음표기와 철자표기를 절충한 우리식 표기법에 대한 정책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엄격한 띄어쓰기 자체는 우리말 총량을 줄이는 병폐가 있다"며 "국어의 풍족한 어휘를 위해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가타가나처럼 상용화된 학술적·사회적 외래어의 경우 위첨자나 아래첨자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보화사회에 발맞춰 국내 전용의 한글 자동교정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외래어와 로마자 표기에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게 국어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 넘쳐나는 신조어나 다양한 속어는 엄정한 검증을 통해 우리말에 편입한다면 국어생태계는 보다 풍부해질 수도 있다.
우문기기자 pody2@ms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