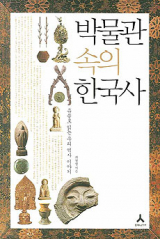
박물관 속의 한국사/최형철 지음/휴머니스트 펴냄
박물관은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친숙한 역사 무대다. 수 천년을 이어온 한민족 역사의 흔적들을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물관 유물 앞에 놓인 짧은 해설만으로는 유물의 숨은 뜻을 짐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것 중 하나가 전시 유물들에 대한 설명이 천편일률적이라는 점이다.
이 책은 단순한 지식 나열이 아니라 박물관 속 유물이 한국사 또는 세계사라는 큰 틀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간됐다. 기자이자 학예사인 저자는 "박물관이 역사의 흐름을 온전히 담아내 관람객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유물들을 시대 순으로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각 유물들이 역사적 맥락 속에서 본연의 의미와 이야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행정지명 외에 아무것도 전해주지 못했던 기존 12개 국립박물관에 새로운 특성을 부여했다. 국립대구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등에 각각 '고대 한국인의 패션 아이콘', '신라 천년의 향기를 좇아', '고대 한반도의 원형질', '임진왜란이 남긴 생채기' 등의 새 이름을 부여한 뒤 각 박물관을 대표하는 유물(총 60점) 선별, 한국사를 이야기한다.
저자는 경주박물관에 소장된 청동거울인 일광경, 소명경, 사유경을 통해 임나일본부설을 합리화하기 위한 일제 식민사학자의 '삼국사기 기록 초기 불신론'을 반박한다. '삼국사기'는 원삼국시대 출발점인 기원전 1세기, 신라, 고구려, 백제가 잇따라 나라를 세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왜가 4세기까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무시한 채 기원전 1세기 신라가 국가로서 온전히 서지 못했다는 주장은 쓰다 소키치에 의해 비롯되었으며 지금까지 학계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기원전 1세기 중국 전한 시대 유물인 이들 청동거울이 경주 조양동 유적 38호분에서 출토 된 것은 신라가 건국 후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한나라와 교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물로 삼국사기 기록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라고 강조한다.
또 저자는 국립대구박물관에 있는 의성 탑리 조우형 금동관에서는 고대 한국인의 패션 아이콘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금동관 가장자리 양쪽을 잘라 새의 깃털처럼 꾸민 것으로 조우관(鳥羽冠)의 경우 고구려 고분 무용총 벽화 뿐 아니라 당나라 장희태자 이현의 묘에 그려진 '예빈도'의 위풍당당한 신라인의 모습에도 나타나 삼국시대 한국인의 외관을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용례라고 지적한다.
이 밖에 책에는 한반도 최초 문자생활을 보여주는 다리호에서 출토된 붓, 청동기 시대 취락 모습을 보여주는 송국리 유적, 통일신라의 백제 유민정책을 보여주는 계유명전씨아미타불삼존석상 등에 대한 이야기도 싣고 있다. 384쪽, 1만 8천 원.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