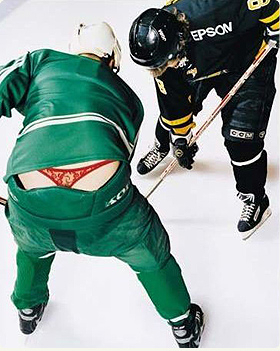
심리학자들은 징크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칼 융은 징크스, 즉 금기의 대부분이 '상징'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미역국과 시험은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지만 단지 미역의 미끌미끌한 느낌과 시험에서 미끄러진다는 것을 결부시킨다는 것. 숫자 4를 죽음과 연결시켜 금기시하는 것도, 사람 이름을 붉은색 펜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실제로는 상징성이 낳은 허상에 불과하단다.
다른 심리학자들은 보상이 주어지는 행동에 대해 앞으로도 동일한 행동을 할 확률이 높다는 '학습이론'을 제시한다. 징크스나 금기는 일종의 조건반사라는 것. 심리학자 스키너는 "개인이나 집단에서 보이는 미신행동의 발달은 우연적 보상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우연히 기우제를 지냈더니 비가 왔다거나, 시험치는데 엿을 먹었더니 합격했다는 등의 우연적인 성공은 징크스의 효험을 믿게 하고 결국 이후에도 꾸준히 그 징크스를 지키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징크스가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축구에서 골대를 맞힌 팀이 진다고 하지만 한번쯤 이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 다시 한번 골대를 맞히는 일이 벌어지고 결국 그 경기에서 졌다면 앞서 이긴 사례는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골대를 맞히는 진다.'는 강박적 징크스만 더 강하게 뇌리에 박히게 된다.
신경정신과 의사들은 징크스를 인간의 심리상태로 접근한다. 징크스의 이면에는 자신감의 결여처럼 심리적 허약함이 도사리고 있다고 본다.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징크스에 의존하게 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부정적 믿음을 갖게 된다 뜻. 실패하고 좌절한 경험이 많은 사람, 자기암시가 강한 사람, 히스테리컬한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에게서 징크스가 많다
#징크스의 비논리성
징크스라는 것은 어제부터 생겨난 걸까? 아마 인류의 탄생과 그 유래를 같이 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운명앞에, 자연의 변화 앞에 무기력한 인간.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이겨내려는 하나의 방편으로 징크스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의지하려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징크스라는 것이 논리적 근거를 가진 것은 아니다. '미신'처럼 합리성은 배제된 채 다만 '그렇게 믿고픈 마음'이 만들어낸 상상력의 결과물에 불과하다. 징크스가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흔히 본다. 어떤 사람에게만 그 '징크스'가 들어맞으며, 사실상 맞지 않는 경우가 더 자주 있지만 그런 사례들은 무시되고 몇 개의 경우로만 확대해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징크스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징크스로부터 많은 부분을 속박 당하거나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징크스를 미신으로 간주하면서도 되도록이면 징크스에 위배되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순 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왜 우리는 징크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